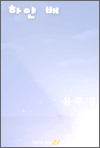상세정보

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 저자
- 윤후명
- 출판사
- eBook21.com
- 출판일
- 0000-00-00
- 등록일
- 2016-07-07
- 파일포맷
- EPUB
- 파일크기
- 0
- 공급사
- 북큐브
- 지원기기
- PC 프로그램 수동설치 뷰어프로그램 설치 안내
책소개
그녀는 몇 개월 전 그곳에서 분명히 그림 그리기에 열중하곤 했었다. 그리고 정말 전시회 초청장이 날아온 것이었다. 그녀가 그곳에서 크레파스로 그려 내게 준 초상화는 이럭저럭 버리지를 못해서 아직도 건넌방에 둘둘 말아 보관하고 있는데, 푸른 줄이 쳐진 환자복을 입고 서 있는 내 머리 위에는 <행복한 모습>이라고 씌어져 있다. 그 무렵 내가 과연 행복한 모습을 하고 있었는지 어땠는지 그것은 좀 가늠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렇게 써놓았었다. 하기야 나는 불행한 모습이었다고는 할 수 없다. 환자복을 입고 있다고 해서 사람이 다 불행한 것은 아닐 것이다. 어렸을 적 언젠가는 하얀 벽의 병실에서 환자복을 입고 파리한 얼굴로 삶에 대하여 무슨 사념엔가 잠겨 있는 사람에 대해 동경을 품었던 일도 있었다. 그럴 때면 나는 어김없이 아아 하고 내 처지를 한탄하곤 했던 것이다. 아아, 사는 거란……
어쨌든 그녀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탁자 위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사과며 귤이며 복숭아가 놓여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걸 그리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녀가 열심히 그리고 있는 것은 기러기인지 고니인지, 그렇게 커다랗게 생긴, 하늘을 날아가는 새였다. 그 커다란 새는 얇게 구름이 깔린 하늘을 날아가고 있었다.
저렇게 큰 새가 어떻게 하늘을 날아다니는지 궁금해요.
나는 느닷없이 말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