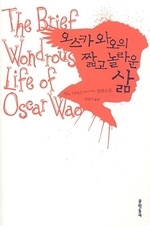그 남자의 연애사
- 저자
- 한창훈
- 출판사
- 문학동네
- 출판일
- 2013-11-02
- 등록일
- 2015-09-25
- 파일포맷
- EPUB
- 파일크기
- 0
- 공급사
- 북큐브
- 지원기기
- PC PHONE TABLET 프로그램 수동설치 뷰어프로그램 설치 안내
책소개
따스한 온기로 마주한 페이지마다 참 섧다 싶은 사랑이 물씬하다!
한창훈이 사 년 만에 들고 온 이야깃거리는 단연, ‘사랑’이다. 아, 좀더 고민해보니 제목으로 쓰인 ‘연애사(史)’가 더 들어맞을 듯하다. 각각 우리는 알게 모르게 자신만이 간직해온 은밀한 ‘연애사’ 하나쯤은 있을 터, 또한 ‘그 남자’가 바로 당신 혹은 나를 지칭하는 것은 당연지사. 제목만으로 이 소설집이 매우 흥미롭고 또 따끔할 것이란 걸 대번에 추측할 수 있겠다. 그것도 이야기라면 “갓 잡아 올린 물고기처럼 펄펄”(문학평론가 서영채, 추천사) 뛰는 소설가 한창훈이라면? 그렇다면 우리 독자는 마음 놓고 실컷 웃을 준비가, 또 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 그동안 그만이 독점적으로 그려내 보인 섬, 그 섬사람만의 위트 속에서 그 ‘사랑’이라는 것을 좀더 가깝게 또는 나의 개인(연애) 역사와 비교해가며 옆사람 힐끔 눈치 보며 읽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고백하건대, 한창훈의 이번 신작 소설집 『그 남자의 연애사』 속에 부려놓은 이 아홉 편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는 나와 연애했던 당신의 연애사, 즉 우리들이 함께 견디고 건너온 ‘연애, 사(事)’인 셈이다.
숱하게 아픈 사연에도 불구하고 끝내 불행하다 말할 수 없는 건
저쪽에서 봄바람이 부는가 싶은데 그만 내 가슴속에 꽃이 피어버리는 것. 쌍방이 그러한 것. 이쪽에서 마늘을 까기 시작하는데 저쪽에는 벌써 밥상이 차려져 있는 것. 그것 또한 서로 그러한 것. 그게 사랑 아닌가.
―「그 남자의 연애사」중에서
‘사랑’이 시간이 흘러 색이 좀 바라고 모양도 좀 낡아지면 어느덧 우리들의 사랑은 어엿한 연애 일지 중 한때의 기록으로 둔갑되어지는 게 다반사였다. 그 연애의 역사를 평생 숨겨온 투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떠나버린 사람은 저만치인데 옆사람 붙들고 울고불고 떼쓰다 보란 듯 아무 일 없이 다시 또 사랑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의 놀라운 사랑 재생력에 한번은 눈을 번쩍 뜨고 놀랐던 적이 적잖았던 것 또한 사실.『그 남자의 연애사』 속 그런 사랑 저런 사랑 애린 사랑 떠난 사랑 등속에서 가슴 뜨끔하지 않을 사람 누구일까. 외로움이었을 것이다. 그 외로움이란 게 어쩌면 사람을 한없이 순하고 원초적으로 만들어놓았을 것이다. 그래서 좋아하게 만들고 사랑하게 만들었을 테니, 사랑이 뭐 별거겠나, “같이 밥 먹고 잠 잘” 사람과 함께 하는 그 단순한 이치를 몰랐을 뿐. 삶은 뭐 또 다르겠나. 사랑이나 삶이나 겪어내는 이치 또한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을 터.
끊임없이 누군가를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 애생이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이어서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아마도 여자들이 모두 거기에 오아시스를 숨기고 있기 때문이겠지 뭐.
―「애생은 이렇게」중에서
오아시스라 했던가. 살아 숨 쉬는 공기라 했던가. 누군가를 좋아하는 이유를 묻는 우문에 현답이 소설에 살짝 들켜 있었다. 한때 우리는 사랑에 전 삶을 바쳐 죽음을 불사하고(저항하고) ‘당신’에 빠져 허우적댔다. 그런데 지금, 그 숨 같던, 오아시스 같던 그 사람은 어디에도 없다. 찾으려 하면 더 못 찾아지는, 되돌리고 싶은 사랑의 과거를 다시 재현하기 위해 그는 그녀를 찾기 위해, “찾아 좀 주시오. 제발. 나는 그 여자 없으면 못 삽니다요”(「뭐라 말 못 할 사랑」)라 말해도 한번 떠나버린 사랑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당연한 이치를 왜 그때는 죽어도 알지 못했을까. 무지몽매하게 또 “우리는 왜 매번 그럴 수밖에 없는”(‘작가의 말’) 사랑에 자꾸 걸려드는 걸까. 소설 대부분의 단초를 만들어주는 대상의 부재. 그 속에서 우리는 다시 대상의 ‘잊힘’에 대해 또 생각할 뿐이다.
사랑은 죽음에 저항하는 행위인 것
오지 말라니까. 너와 우리의 인연은 여기까지인가보다.
……
너는 살아라
살기 위해 그는 세상을 떠돌았다.
―「그 남자의 연애사」 중에서
사랑해야 했던 건 살기 위한 한 방편이었으리라. 숨쉬기 위해 사랑하는 것. 살아내는 의지가 만들어낸 사랑. 예컨대, ‘작가의 말’을 보자.
“사랑을 뜻하는 스페인 말이 ‘amor’이다. ‘mor’는 죽음, ‘a’는 저항하다, 이다. 사랑은 죽음에 저항하는 행위인 것이다. 이 단어를 알고 나서야 독한 불면과 눈물을 감수하면서까지 사람들이 거듭 사랑에 빠지는 이유를 이해하게 되었다.”
참 무섭고 애끓는 것이 아닌가, 사랑은.
한창훈의 이번 신작 소설집 『그 남자의 연애사』 속 사랑 이야기는 삶과 사랑의 겸침이다. 그가 들려주는 편편의 사랑 속에는 삶의 무늬(의지)가 스며들어 있고, 우리가 겪는 삶(사랑)의 시작과 끝을 말하고 있으며 그 안에 파도치는 다양한 연애(삶의 무늬)의 형국이 섬세하게 갖가지 일화로 뻗어 있다. ‘사랑을 하자’가 ‘삶을 살자’로 읽히는 소설. 그런 연유로 이 소설집을 끝까지 다 읽고 나면 가슴이 먹먹하다가도 삶의 긍정 에너지로 가득 찬 의지를 다짐하게 된다. 외로운 사정으로 생겨난 숱한 아픈 사연들 속에서 꿈틀, 태동하는 삶의 의지. 바로 한창훈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수많은 연애사(事)를 통해 건네는 ’발로(發露)‘가 바로 그런 게 아닐까.
작가의 말
사랑은 굶주린 개 앞에 던져진 상한 고깃덩어리와 같다. 개는 앞뒤 가리지 않고 덥석 문다. 허기가 가시고 포만감이 드는가 싶지만 식은땀과 뒤틀림과 발작이 곧바로 찾아온다. 끙끙 오랫동안 앓아야 한다. 그 시기가 지나면 또 한번의 고깃덩어리가 던져진다. 저것을 삼키면 식은땀과 뒤틀림, 발작이 틀림없이 찾아온다는 것을 알고 있다. 뻔히 알면서도 또 덥석 문다.
우리는 왜 매번 그럴 수밖에 없는가.
사랑을 뜻하는 스페인 말이 ‘amor’이다. ‘mor’는 죽음, ‘a’는 저항하다, 이다. 사랑은 죽음에 저항하는 행위인 것이다. 이 단어를 알고 나서야 독한 불면과 눈물을 감수하면서까지 사람들이 거듭 사랑에 빠지는 이유를 이해하게 되었다.
이 책은 그런 우리들의 연애사이다.
2013년 봄. 소나무가 휘어져 있는 연희문학창작촌에서 한창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