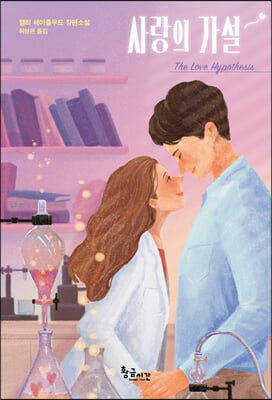엄마는 산티아고
- 저자
- 원대한
- 출판사
- 황금시간
- 출판일
- 2015-04-14
- 등록일
- 2015-09-25
- 파일포맷
- EPUB
- 파일크기
- 0
- 공급사
- 북큐브
- 지원기기
- PC PHONE TABLET 프로그램 수동설치 뷰어프로그램 설치 안내
책소개
이충걸 편집장?황경신 작가 추천!
글 쓰고 그림 그리는 아들, 엄마 따라 덜컥 여행을 떠나
봄 가을 산티아고 풍경을 담은 감성 사진?드로잉 수록
“아들, 엄마랑 같이 산티아고 걸을래?”
어느 날 엄마가 던진 한마디에 덜컥 800킬로미터의 산티아고 순례길을 따라나선 아들. 느릿느릿 엄마의 속도에 맞춰 걸으며 길 위의 낯선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세계 곳곳에서 온 여행자들과 만나며 여태 해온 것과는 조금 다른 여행을 경험한다. 반밖에 못 걷고 돌아온 봄날, 멈췄던 그 자리로 돌아가 남은 길을 마저 걸은 가을날, 두 계절의 이야기를 저자의 감성이 묻어난 드로잉, 사진들과 함께 담았다. 산티아고의 봄, 가을 풍경은 초판 한정 독자 선물 사진엽서 부록으로도 만나볼 수 있다.
카미노를 걷는 동안, 아들은 엄마의 여러 모습과 마주한다. 봄처럼 환하게 웃는 여고생, 왈칵 눈물을 쏟는 길 잃은 어린아이, 돌아가신 엄마를 그리워하는 딸, 멀리 두고 온 남편을 그리워하는 아내, 시아버지 제삿날 못 챙길까봐 걱정하는 며느리……. 여태 한 번도 궁금해 하지 않았던 엄마의 수많은 표정과 다양한 인생이 길 위에 펼쳐진다.
아들은 비로소 엄마를 이해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엄마의 삶을 존중하리라 마음먹는다. 어느새 엄마의 '꿈길'이었던 산티아고 순례는 아들에게도 ‘한 걸음 한 걸음이 당신과 함께여서 더 좋았다’고 고백하게 되는, 꿈같은 시간으로 남는다.
꿈길 800킬로미터를 느릿느릿
엄마와 함께 걷다
아들, 엄마의 삶을 여행하다
우리는 엄마의 삶을 얼마만큼이나 이해하고 있을까. 한때 소녀였고, 여자였던, 아니 어쩌면 여전히 그 모습을 간직한 그녀들을 ‘엄마’라는 이름 속에 꼭꼭 묶어두지 않았던가. 이 책은, 엄마의 삶을 궁금해한 적 없던, 이미 다 커버린 아들이 엄마와 여행한 두 계절의 시간, 800킬로미터의 여정을 담고 있다.
비올라를 켜고 그림을 그리며, 월간 〈PAPER〉의 필진이자 디자인을 공부하는 저자는 20대 후반의 남자. '마초남'보다 '초식남'에 가까우며, 딸처럼 살갑고 친구처럼 다정한, 이 시대 엄마들이 바랄 만한 근사한 아들이다. 하지만 다감하긴 해도 엄마랑 단둘이, 긴 시간 여행한 적은 없었던 평범한 대한민국의 '건아'이기도 하다.
저자는 얼떨결에 따라나선 먼 타국 땅에서야 비로소 엄마의 민낯을, 인생의 면면을 들여다본다. 마냥 투정부려도 될 만만한 사람이 아닌, 매일 잔소리를 해대는 골치 아픈 참견꾼이 아닌, '엄마'라는 사람의 삶을 떠올려보고 미처 몰랐던 여러 모습에 놀라며, 마침내 그녀를 응원한다.
난생 처음 보는 엄마의 꽃 그림 실력에 놀라고, 까만 밤하늘에 쏟아질 듯 빛나는 별을 올려다보며 엄마가 들려주는 별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끝말잇기를 하며 엄마 세대의 언어를 알아간다. 그 어느 모녀보다 더 오붓한 모자지간이 된다.
느린 여행자를 꿈꾸다
모자(母子)에게 카미노는, 산티아고는, 급하게 달려가야 할 목적지가 아니다. 엄마의 걸음에 보폭을 맞춰 느릿느릿 걷다가 만난 느린 여행자들에게도 그러했다. '어머니 가방이라도 들어드리겠다'며 기어코 짧게라도 함께 걸은 친구 영진, '카미노 가족'이 된 마이애미에서 온 애순이 아줌마, 돌아가신 아버지를 추억하며 함께 걷는 브룩 가족, 산소통을 짊어진 채 간신히 걸음을 내딛는 노부부까지. 산티아고를 찾은 사연은 저마다 달랐지만 모두 천천히 길을 음미하고, 마음을 치유하며 함께 걷고 있었다.
모자에게는 순례길 완주보다 봄 가을의 찬란한 카미노 풍경이, 걷고 쉬고 밥 먹는 소소한 일상이 더 소중했다. 따뜻한 문체와 작가 특유의 시선을 살린 사진, 카미노 풍경을 스크랩하듯 포착한 드로잉은 우리를 느린 여행자들의 여정 한복판으로 이끈다.
엄마와 아들의 여행은 매일매일 축제였다. 800킬로미터의 순례길은, 두 계절의 동행은, 아들이 엄마에게 다가서는 길이자 두 마음이 포개어진 시간이었다. 그러므로 믿는다. 엄마도 아들도 언젠가 또 다른 꿈길을 향해 떠날 것을. 그리고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도, 엄마와 발맞춰 걸어보는 귀한 시간이 언젠가 선물처럼 찾아올 것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