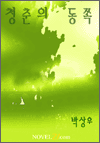상세정보

천국에서 돌아오다
- 저자
- 하창수
- 출판사
- eBook21.com
- 출판일
- 0000-00-00
- 등록일
- 2016-07-07
- 파일포맷
- EPUB
- 파일크기
- 0
- 공급사
- 북큐브
- 지원기기
- PC 프로그램 수동설치 뷰어프로그램 설치 안내
책소개
《라마할디》.
뭔가 그럴듯한 얘기를 숨기고 있을 법한, 프로스트의 시보다는 훨씬 매력적일 것 같은, 만지면 깊게 가라앉은 열반의 속삭임이 스믈스믈 기어나올 것 같은, 그런 책이었다. 물론 처음에는 그랬다. 첫 장을 펼쳤을 때,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기에 더욱.
신의 영혼을 가진 자, 위대한 샤의 후손들에게
힌두어에 그리 밝은 나는 아니었지만, 그 에피그램이 가해오는 황홀한 내음은 충분히 맡을 수가 있었다. 바로 그 때문이었던 것이다. 탐사 여행의 끝을 향해 가고 있는 지금까지 나로하여금 그 책을 버리지 못하게 만든 것은.
니체가 지난 세기의 벼랑에서 신(神)과 함께 절벽 밑으로 투신했음을 기억하지, 조? 하지만 니체만 죽고 신은 부활하고 말았지. 그래서 니체는 어리석었을까? 잘 듣게. 니체와 함께 벼랑 밑으로 떨어졌던 신의 부활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었다네. 니체의 투신 자살은 죽음을 목적하지 않았으니까. 니체의 투신은 한 편의 화려하지만 우울한 쇼였어. 니체는 잘 알고 있었지. 하지만 니체만 알고 있었던 게 아니었어.
- 본문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