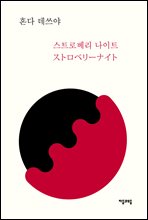책등에 베이다
- 저자
- 이로
- 출판사
- 이봄
- 출판일
- 2014-07-01
- 등록일
- 2014-11-26
- 파일포맷
- EPUB
- 파일크기
- 0
- 공급사
- 북큐브
- 지원기기
- PC PHONE TABLET 프로그램 수동설치 뷰어프로그램 설치 안내
책소개
2014년 한국형 “독자의 탄생”
우리는 그 순간을 목격한다!
작가의 죽음과 진정한 독자의 탄생
이 책은 25종의 책들을 소재로 이야기를 시작한다. 첫 번째 책은 『꼬마 니꼴라』 3권이다. 그런데 장 자크 상페의 그림이 곁들여진 르네 고시니의 것이 아니라, 김모세가 구성하고 이규성이 그림을 그린 판본이다. 또한 한강의 소설 『내 여자의 열매』에 붙인 장 제목은 [이십대의 스포츠]이다. 뜬금없이 르 코르뷔지에의 『작은 집』과 술에 대한 만화 『스트레이트 온 더 락』을 한데 엮어 이야기하기도 한다. 책을 나열한 책이니, 독서일기라 생각한다면 추천사를 쓴 소설가 김중혁의 말대로 “미로”에 빠지고 만다.
저자는 서교동에서 작은 책방 ‘유어마인드’를 운영하고 있다. 그는 이 책의 저자이지만, 동시에 수많은 책들의 충실한 독자이기도 했다. 훌륭한 독자가 저자의 위치를 획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책에 대한 책’을 쓰는 일일 것이다.
하지만 저자는 이 손쉬운 예상마저 보기 좋게 배신한다. 저자는 오히려 롤랑 바르트가 『저자의 죽음』에서 이야기한 “작가의 죽음의 대가로 우리가 얻는 것은 독자의 탄생이어야 한다는 말에 충실하다.
저자는 롤랑 바르트의 말에 기대어 이 책을 쓴 것이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책을 통해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아주 훌륭한 “독자의 탄생”을 목격하게 된다.
이 책은 저자가 소개하고 있는 책의 작가나 줄거리 소개는 물론이고 작품의 의미를 찾지 않는다. 심지어 각각의 책에서 엄청난 분량의 문장을 인용해놓았지만, 그 인용문들은 저자의 이야기 속에 스며들어버린다.
이런 식이다. 프로필에서 “짧은 분량의 작품들, 3분 30초의 음악, 콩트를 편애한다”고 밝힌 저자는 5장 [다 괜찮다 對 다 망한다]에서 게으르고 끈기 없고, 나태하기 때문이라고 눙친다. 하지만 “거대한 부분보다 사소한 전체”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기 때문이라는 분명한 이유를 댄다. 그러면서, 고등어 냄새라는 사소한 것에 대한 자신의 콩트와 화가 에드워드 호퍼에 대한 작가론도 아니고, 개인 에세이도 아닌 시인 마크 스트랜드의 [빈방의 빛]의 일부를 나란히 읽게 한다. 저자의 콩트와 저자가 인용한 책의 저자인 마크 스트랜드의 글은 설득력 있게 서로를 부추긴다.
훌륭한 독자만이 뽑아낼 수 있는 인용문들, 그것이 아주 사적인 인용문으로 재탄생하는 순간이다.
“독자의 탄생”은 책에서 저자가 아닌 ‘텍스트’만 따로 떼어와 자기 식으로 이야기를 상상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그 상상을 그동안 위안의 도구로만 삼거나 리뷰라는 형식을 통해 지식 권력을 드러내는 데 그쳤다면, 이 책의 저자는 자기만의 글쓰기를 시도한 것이다. 진정한 “독자의 탄생”이다.
저자는 이 세상에서 책 속 드라마의 주인공도 아니고, 이름을 날리는 작가도 아닌 그저 이름 없는 독자에 불과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새로운 “독자의 탄생”을 획득할 수 있는가를 모범적으로 보여준다.
독자의 탄생은 젊음의 전략이다
사실 롤랑 바르트가 말한 “독자의 탄생”은 저자에게 이미 당면한 과제였다. 단지 어떻게 탄생시킬 것인가의 문제가 남았던 것이다. 세상은 모든 것이 죽었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1981년생, 국문학도였던 저자에게 바로 앞 세대의 그림자는 너무 짙다.
자세한 이유까지는 몰라도 당시 국문과 아이들 사이에서 김영하의 존재는 우리가 하려고 했던 것을 먼저 한, 아주 치사한 작가처럼 받아들여졌다. 무지였고 질투였다. 나는 그가 어떤 표정으로 말하고 어떤 몸짓으로 이야기하는지 궁금했다. “우리 갈 길을 선점하시다니, 그런데 그 전략적 오토바이는 1인승입니까? 옆에 자리 없어요?” 물어보려 했던 것일까.
-[이십대의 스포츠]에서(39쪽)
또한 저자는 대학 시절부터 최근까지 세상으로부터 끊임없이 죽음을 선고 받았다는 말로 이 책을 시작한다. “인문학의 죽음, 문학의 죽음, 서점의 위기와 출판의 죽음.”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수많은 유령들 사이에서 다시 떠오른 것은 그 시절 보았던 펜싱 경기였다. 우측의 선수가 주춤주춤 물러서기 시작했고, 해설자는 그것을 “롱프르”라고 했다. 후퇴에도 용어가 있다니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는 다시 한번 찌르기 위한 후퇴라 말했다. 성공할지 실패할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찌르기 위해 물러나는 것. 결국 우측 선수의 마지막 한 방은 무위로 돌아갔지만 나는 혼자 중얼거렸다. ‘집중하여 물러서는 뒷걸음…’
-[유령의 롱프르]에서(20쪽)
어느 날인가, 글을 써야겠다고 생각했다. 여기까지 쓰다가, 의문이 생긴다. 글을 써야겠다는 생각은 스스로 강박하는 의미가 강한데, 글은 의무보다 의지에서 비롯되지 않을까. 의무로 쓴 글은 허약한 냄새를 남기지 않을까. 이제 그만 이 글을 폐기하기로 한다. 구겨 휴지통에 버리려 한다. 그런데 이 글은 촉감 가득한 종이 위가 아닌 모니터 상에 쓰인 것이어서, 실없는 클릭 몇 번을 해야 한다. 열 개의 손가락과 열 개의 발가락 중 단 하나의 손가락만 움직여 삭제, 삭제. 너무하다. 나는 글을 폐기하지 않기로 한다. 대신 인용의 창고에서 꺼낸 남의 글에 대해 쓰기로 한다.
-[글을 써야겠다]에서(220쪽)
‘인용’은 훌륭한 독자로서의 자세이기도 하지만, 저자가 뒷걸음 전략 중 하나로 꺼내든 것이기도 하다. 죽음을 선고 받았으며, 애당초 경쟁마저도, 즉 의자놀이 기회마저도 없는 시대라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세상에 나온 것들을 자기 식대로 인용하는 것이다. 자기만의 글을 쓰고자 한다면 타인의 책을 인용하는 것이다. 인용할 책이 세상에서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눈앞에 무한대로 펼쳐진 수많은 매체들을 ‘자신만의 기준’으로 편집하여, 자신의 세계로 끌어오는 것이 “롱프르” 전략이다.
다시 말하면, 이 책은 ‘88만원 세대’이며 장기불황을 직감적으로 받아들인 세대에게 “롱프르”를 제안하는 것이며, 그래서 저자가 먼저 자신의 롱프르를 펼쳐 보이는 것이다. 그의 생존 전략이 성공적인지는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알게 된다. 저자는 “이 후퇴의 기록을 따라 읽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전진하게 된다”고 말한다.
시인 이제니는 추천의 글에서 이렇게 말한다. “당신은 어떤 페이지들을 건너와 당신 자신으로 남을 수 있었는지, 당신도 당신만의 언어를, 당신만의 빛나는 먼지의 세계를 펼쳐 보이라고.”
이 책은 자신만의 언어를 찾기 위한 젊음의 시도이기도 하다. 이 책의 반짝임은 소설가 김영하에게 치기어린 목소리로 “옆에 자리 없어요?”라고 묻고 싶었다던 젊음이 이제는 “됐습니다. 내 자리는 내가 만들어볼게요”라고 말하며 아프지만 툭툭 털고 길을 찾아가는 데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