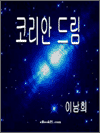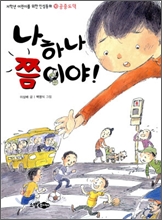수색, 어머니 가슴 속으로 흐르는 무늬
- 저자
- 이상배
- 출판사
- eBook21.com
- 출판일
- 0000-00-00
- 등록일
- 2016-07-07
- 파일포맷
- EPUB
- 파일크기
- 0
- 공급사
- 북큐브
- 지원기기
- PC 프로그램 수동설치 뷰어프로그램 설치 안내
책소개
“그 망할 게 느 에미를 따라 간 게 아닌지 모르겠다.”
“뭐가요?”
“화투 말이다. 없어진 게.
“어머니가 그걸 왜 들고 나가시겠어요? 또 어머니가 나가시고 나서도 있었다면서요.”
“그러니 뒤에 따라갔을지도 모른다는 거지. 흑싸리는 가시밭길이라는데 병원에서 뭐 안 좋은 얘기를 들으려고 그러나……”
아버지는 담요를 한 번 더 접어 구석으로 밀치며 말했다.
내가 어릴 때부터 어머니는 그렇게 자주 머리와 골치가 아프다고 했다.
“왜 그렇게 머리가 아프신데요?”
하고 물으면 어머니는 어머니가 살아온 날 모두가 그렇다고 했다.
“그러니 느들은 제발 커서 여편 속 썩이지 말고 에미 가슴 썩이지 마라.”
그때 어머니는 지금보다 자주 가루 진통제를 먹었다. 우리는 그 약을 골 아픈 데 먹는 약이라고 불렀다. 그때처럼 자주는 아니지만 어쩌면 지금도 어머니가 그것을 늘 머리맡에 두고 있는 것은 그것에 이제 인이 박혀서인지 모른다. 이제 어머니가 그렇게 늘 머리가 아프고 골치가 아파야 할 일은 사실 그렇게 없었다.
“느들 보기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다만 내가 굳이 그걸 입고 싶어서 그런다.”
“가서 또 벗으셔야 하고 그러니까……”
“왜, 그래서 남들이 보면 우세스러울까봐 그러나? 자식들이 에미 내복 하나 제대로 못 사줘 이런 걸 입고 있다고 그럴까 싶어서?”
“아뇨, 그게 아니라……”
“느 눈엔 헌 내복이지만 내 눈엔 그렇지 않다. 아범들이 젊을 때 입던 내복들이다. 자식들이 입던 내복 에미가 껴입는다고 해서 흉될 일인 것도 아니고.”
형수가 조금은 당황하고 놀라는 얼굴로 아내 쪽을 돌아보았다. 아내 역시 같은 얼굴로 멀거니 어머니와 형수를 바라보았다.
그러다 이내 나와 눈이 마주치자 당신이 어떻게 좀 해봐요, 하는 눈빛을 했다. 그러나 어머니가 굳이 그러시겠다는 걸 어느 자식인들 말릴 수 있겠는가. 아버지 역시 같이 방안에 있으면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