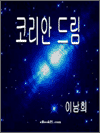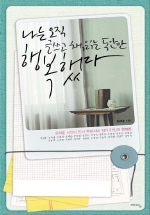천지간
- 저자
- 윤대녕
- 출판사
- eBook21.com
- 출판일
- 0000-00-00
- 등록일
- 2016-07-07
- 파일포맷
- EPUB
- 파일크기
- 0
- 공급사
- 북큐브
- 지원기기
- PC 프로그램 수동설치 뷰어프로그램 설치 안내
책소개
외숙모의 장례식에 가던 중 낯선 여자의 뒤를 밟아가게 되는 <나>. 수많은 우연의 연쇄와 반복으로 점철되는 <나>의 예기치 않은 행로. 이러한 우연성은 그러나 운명적인 필연으로 귀결되어 간다. 우연과 필연을 이어주는 연결고리는 <인연>이라는 종교적 의미와 흰색의 이미지이다. 나와 여자는 허옇게 떠오른 보름달의 세례를 받으며 알몸과 알몸으로 만난다. <나>는 이 만남을 기이한 인연이라 말한다. 세상엔 참으로 여러 가지의 만남이 있는 모양이고 그걸 행여 인연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 여자와의 만남은 분명 기이한 인연에 속하는 일이었다.
그날 새벽 왜 여자가 내 방으로 왔는지 물어보지 않았다. 그런 일은 서로 묻고 대답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닌 성싶다. 여자도 그런 자신을 명백히 꿰뚫어보고 있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 여자와의 만남은 처음부터 그런 식이었고 헤어질 때도 역시 그랬다. 세상엔 참으로 여러 가지의 만남이 있는 모양이고 그걸 행여 인연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 여자와의 만남은 분명 기이한 인연에 속하는 일이었다. 문을 열고 나서 나는 여자가 들어오게 옆으로 조금 비켜섰고 그런 다음 뒤에서 문을 닫아걸었다. 서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여자는 젖은 옷을 한 겹씩 한 겹씩 벗어 옷걸이에 걸어놓고는 알몸으로 이불 속에 들어가 눈을 감고 반듯하게 누웠다. 커튼을 치고 불을 끄자 남은 어둠이 그물처럼 드리워졌다.
그러나 정녕 나는 모르고 있었다. 그날 새벽 남은 어둠 속에 보름달이 떠 있었다는 것을. 여자와의 관계가 끝나고 난 다음에야 나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바로 내 손바닥 안에 달이 떠 있다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