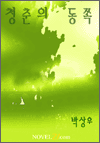지나가는 자의 초상
- 저자
- 윤대녕
- 출판사
- eBook21.com
- 출판일
- 0000-00-00
- 등록일
- 2016-07-07
- 파일포맷
- EPUB
- 파일크기
- 0
- 공급사
- 북큐브
- 지원기기
- PC 프로그램 수동설치 뷰어프로그램 설치 안내
책소개
가슴에 지워지지 않는 자국을 남긴 지난날을 돌이켜보는 한 사나이에 대한 이야기
한 사람의 삶에 있어서 어떤 일들은 우연인 듯 다가왔다가 오래도록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겨 먼 훗날에도 걷잡을 수 없는 파문을 불러일으킨다. 한편의 아름다운 드라마를 보는듯한 윤대녕의 단편소설이다.
과거의 흔적들을 뒤적이다 보면 내가 지금 떠올리고 있는 기억의 정확한 생성연도를 산출해 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일기 따위의 연대기를 기록해 두는 인간은 아니며 더욱이 삶의 사실에 관계된 것들에 그닥 집착하며 살아가는 타입의 인간도 아니다. 사실(事實)이란 문득 또 하나의 환영에 불과한 것이어서 사소한 기억들은 때로 피처럼 생생하면서도 그것을 포함하고 있는 공간에 무너져 있기가 일쑤다.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일들이란 내게 있어선 대개가 그렇게 새벽녘의 창의 형체 없이 어른거리는 물상(物像)처럼 보일 뿐이다. 과거에 있었던 일은 물론이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도, 앞으로 생길 일도 내겐 모두가 그렇게 생각된다. 때로는 무엇에 집착하고 매달려도 보았지만, 오직 나의 이름을 부르며 내게 다가왔던 것들조차 얼마후면 한결같이 나를 외면하고 멀어져 갔으며 곧이어 또다른 일이 밀어닥치곤 했다. 나는 당장에 내게 일어나는 일을 추스르는데 급급하며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바닥이 뚫린 배에서 정신없이 물을 퍼내듯이 말이다. 그리하여 내 가난한 젊은 날의 책상 위에는 매양 밀린 숙제들이 잔뜩 쌓여 있어,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으면 아무도 내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었다.
그러다 잠깐의 휴지기처럼, 아무 돌출적인 사건도 없는데 그야말로 조용한 내 인생의 짧은 한때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적막한 시기의 한가운데서 나는 누군가를 만났던 것이다.
- 본문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