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전거 여행 1
- 저자
- 김훈
- 출판사
- 문학동네
- 출판일
- 2015-01-15
- 등록일
- 2015-09-25
- 파일포맷
- EPUB
- 파일크기
- 0
- 공급사
- 북큐브
- 지원기기
- PC PHONE TABLET 프로그램 수동설치 뷰어프로그램 설치 안내
책소개
몸과 마음과 풍경이 만나고 갈라서는 언저리에서 태어나는 김훈 산문의 향연!
김훈 산문의 정수(精髓)라 할 산문 『자전거여행』이 재출간되었다.
언젠가 그는 “나는 사실만을 가지런하게 챙기는 문장이 마음에 듭니다”라고 말한바 있다. 그의 언어는 그렇게, 언제나, 사실에 가까우려 애쓴다. “꽃은 피었다”가 아니라, “꽃이 피었다”라고 고쳐쓰는 그의 언어는, 의견과 정서의 세계를 멀리하고 물리적 사실을 객관적으로 진술하려는 그의 언어는, 화려한 미사여구 없이 정확한 사실을 지시하는 그의 언어는, 바로 그 때문에 오히려 한없이 아름답다. 엄격히 길에 대해서, 풍경에 대해서만 말하는 그의 글 속에는, 그러나 어떤 이의 글보다 더욱 생생하게 우리 삶의 모습들이 녹아 있다.
그의 문장 속에서, 길과 풍경과 우리네 삶의 모습은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 그것들은 만났다가 갈라서고 다시 엉기어 하나가 되었다가 또다시 저만의 것이 된다.
봄은 이 산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이 산을 떠나는 것도 아니었다. 봄은 늘 거기에 머물러 있는데, 다만 지금은 겨울일 뿐이다.
봄은 숨어 있던 운명의 모습들을 가차없이 드러내 보이고, 거기에 마음이 부대끼는 사람들은 봄빛 속에서 몸이 파리하게 마른다. 봄에 몸이 마르는 슬픔이 춘수(春瘦)다. (…) 죽음이, 날이 저물면 밤이 되는 것 같은 순리임을 아는 데도 세월이 필요한 모양이다.
갈 때의 오르막이 올 때는 내리막이다. 모든 오르막과 모든 내리막은 땅 위의 길에서 정확하게 비긴다. 오르막과 내리막이 비기면서, 다 가고 나서 돌아보면 길은 결국 평탄하다.
자전거를 타고 저어갈 때, 세상의 길들은 몸속으로 흘러들어온다. (…) 흘러오고 흘러가는 길 위에서 몸은 한없이 열리고, 열린 몸이 다시 몸을 이끌고 나아간다. 구르는 바퀴 위에서, 몸은 낡은 시간의 몸이 아니고 현재의 몸이다.
빛 속으로 들어가면 빛은 더 먼 곳으로 물러가는 것이어서 빛 속에선 빛을 만질 수 없었다…
꿰맨 자리가 없거나 꿰맨 자리가 말끔한 곳이 낙원이다. 꿰맨 자리가 터지면 지옥인데, 이 세상의 모든 꿰맨 자리는 마침내 터지고, 기어이 터진다.
언젠가 그는 “나는 몸이 입증하는 것들을 논리의 이름으로 부정할 수 있을 만큼 명석하지 못하다”고 말한바 있다. 그의 산문이 명문인 것은, 상념이 아닌 몸으로 쓴 글들이기 때문이 아닐까.
그는 글 속에서, 오징어 고르는 법, 광어 고르는 법을 이야기하고, 좋은 소금을 채취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시 쓰는 “김용택씨”가 가르치는 섬진강 덕치마을 아이들의 소박한 생활들을 이야기한다.
인수는 할머니 품에서 자랐다. 인수네 할머니는 작년에 돌아가셨다. 인수는 많이 울었다.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내 마음은 슬프다. 나는 정말로 슬프다’라고 인수는 그날 일기에 썼다. 인수는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 좀 시무룩한 아이가 되었다. 점심시간에도 혼자서 밥을 먹는다. (…)
은미네 할머니 무덤은 학교 가는 길 산비탈에 있다. 학교에서 짓궂은 남자아이들이 은미를 지분거리고 귀찮게 굴면, 은미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할머니 무덤에 들러서 그 못된 녀석들의 소행을 다 할머니한테 일러바치고 막 운다. 요즘엔 은미의 마음이 좀 열렸다. 슬픔이 다소 누그러졌는지 친구들하고 잘 놀고 아이들도 이제는 은미를 지분거리지 않는다. 은미는 그동안 정말로 고생 많았다.
일체의 평가나 감상 없이, 있는 그대로를 서술한 후, 그는 덧붙인다.
마암분교 이야기는 한도 없고 끝도 없다. 전교생 17명인 이 작은 학교에서는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매일매일의 새로운 이야기들이 샘솟아 오른다. 날마다 새로운 날의 새로운 이야깃거리가 있다. 삶 속에서 끝없이 이야기가 생겨난다. 이 얼마나 아름답고 신나는 일인가. 봄에는 봄의 이야기가 있고 아침에는 아침의 이야기가 있다. 없는 것이 없이 모조리 다 있다. 사랑이 있고 죽음이 있고 가난과 슬픔이 있고 희망과 그리움이 있다. 세상의 악을 이해해가는 어린 영혼의 고뇌가 있고 세상을 향해 뻗어가는 성장의 설렘이 있다. 여기가 바로 세상이고, 삶의 현장이며, 삶과 배움이 어우러지는 터전이다.
그가 길과 풍경과 계절을 이야기할 때, 그 안에는 우리의 삶이 고스란히 들어 있다. 비유나 은유가 아니라, 문장 그 자체로 우리의 삶이다. 풍경과 우리의 삶이 그의 문장 안에서 일대일로 대응한다.
인문학자 박웅현의 말처럼, “줄을 치고 또 쳐도 마음을 흔드는 새로운 문장들이 넘쳐”날 뿐 아니라, 책을 펴들 때마다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그의 문장을 이 책에서 다시금, 확인한다.
자전거 한 대가 미끄러지듯이 들어오고 있다. 자전거 위에 물음표처럼 몸을 숙인 원색의 헬멧과 사이클복의 조화는 이국적이었다. “저 모던보이 좀 봐!” 그가 바로 ‘청년 김훈’이었다. 자동차와 문명이 통제된 길들을 저렇게 날렵한 물음의 자세로 탐문하며, 굴리면서 굴러가고, 싣고 가면서 실려갔었구나. 자전거와 한몸 되어 다만 밀고 나갔었구나. 밀고 나가는 순간 길의 몸이 노곤하게 풀리면서 열렸었구나.
‘밥벌이’의 가파름에서부터 ‘문장’을 향한 열망까지를 넘나드는 ‘처사(處士) 김훈’의 언(言)과 변(辯)은 차라리 강(講)이고 계(誡)다. 산하 굽이굽이에 틀어앉은 만물을 몸 안쪽으로 끌어당겨 설(說)과 학(學)으로 세우곤 하는 그의 사유와 언어는 생태학과 지리학과 역사학과 인류학과 종교학을 종(縱)하고 횡(橫)한다. 가히 엄결하고 섬세한 인문주의의 정수라 할 만하다.
진정 높은 것들은 높은 것들 속에서,
진정 깊은 것들은 깊은 것들 속에서 나오게 마련인가보다.
_정끝별(시인, 문학평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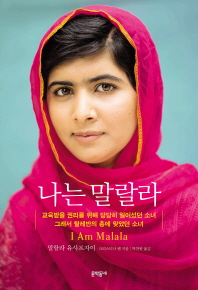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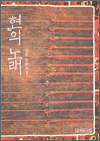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