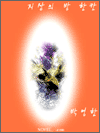코카콜라 애인
- 저자
- 윤대녕
- 출판사
- eBook21.com
- 출판일
- 0000-00-00
- 등록일
- 2016-07-07
- 파일포맷
- EPUB
- 파일크기
- 0
- 공급사
- 북큐브
- 지원기기
- PC 프로그램 수동설치 뷰어프로그램 설치 안내
책소개
그가 사고를 당한 것은 정확히 5시 5분이었다. 그것도 내가 바라보는 앞에서, 의료보험회관 건물로 들어갔던 그가 밖으로 나온 건 때마침 스피커에서 모차르트의 「레퀴엠」이 흘러나오고 있을 때였다. 빗줄기에 갈라진 그의 형체가 낡은 스크린에서처럼 음산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 순간엔 나도 직감적으로 알았던 듯하다. 곧 사고가 나리라는 것을, 순간 나는 자리에서 튀어 일어났고 그와 동시에 그가 대드는 듯한 자세로 차들이 질주해가고 있는 도로로 내려섰다. 그러고 나서 나는 옆 테이블에서 질러대는 여자들의 비명을 들었다. 맙소사. 그가 택시에 치여 몸이 공중으로 1미터쯤 튀어오른 다음 길바닥으로 빈깡통처럼 떨어져 내렸다. 눈을 의심했지만 일은 이미 벌어지고 난 다음이었다.
바닷속에서의 마지막 섹스, 하고 나는 눈을 뜨며 중얼거린다. 화성군 송산면 고포리. 그는 어떤 여자와 그곳에 갔던 것일까. 하늘색 카페에서 본 여자의 얼굴이 좀처럼 생각나지 않는다. 6월 20일이라고 했지. 그들이 차를 몰고 들어가 정사를 나눴던 바닷속 큰 평지는 그날 사라지게 된다.
나는 머리를 흔들며 침대에서 일어나 앉는다. 애써 잊으려해도 어제 일이 자꾸 되살아난다. 내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이토록 조용한 인생인데도 어느날 누군가 군홧발 소리를 내며 다가와 이마에 총을 겨눈다. 삶은 그런 것이다. 그렇게 덜미가 잡히게 되면 거기서 빠져나가기가 꽤 힘들다. 어디론가 숨어버려야 하는 걸까. 별들이 회전하는 방향으로? 하지만 다시 원래의 지점으로 돌아오게 될 텐데.
마음이 차고 몸도 찬 밤이었다. 방은 여전히 달의 둘레를 미끄러지듯 돌고 있었다. 어디선가 백합 냄새가 났다. 머리가 어지러웠다. 나는 정동진에 있는 걸까. 서울에 있는 걸까. 옆에 누워 있는 여자만이 그나마 아슬아슬하게 내 존재를 확인시켜주고 있었다.
사마귀처럼 자신을 조금씩 파먹으며 살아왔어요. 언젠가는 뼈만 앙상하게 남아 아무도 모르는 숲 속에 혼자 떨어져 죽겠죠.
나는 베개에서 그녀 쪽으로 머리를 돌렸다. 그녀는 천장을 향해 똑바로 누워 있었다. 오래 전 파타야에서 생긴 일을 생각하고 있는 걸까. 그래, 삶은 많은 경우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불행은 그런 식으로 엉겁결에 닥쳐온다.
눈 내린 벌판의 나무들이 한 그루씩 쓰러지고 있다. 그 끝으로부터 웬 벌거벗은 아이 하나가 이쪽을 향해 걸어오고 있다. 나는 부신 눈으로 그 눈사람처럼 생긴 아이를 바라보고 있다. 정동진 앞바다에서 보았던 그 아이다. 그러므로 나다.
그가 가까이 왔다. 와서, 아주 조그맣고 차디찬 손으로 내 이마를 슬쩍 건드리더니 냉큼 손을 거두었다. 나는 사무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머리에 털이 하나도 없는 다섯 살쯤 돼보이는 아이였다. 그 아이에게 나는 속삭이듯 물었다.